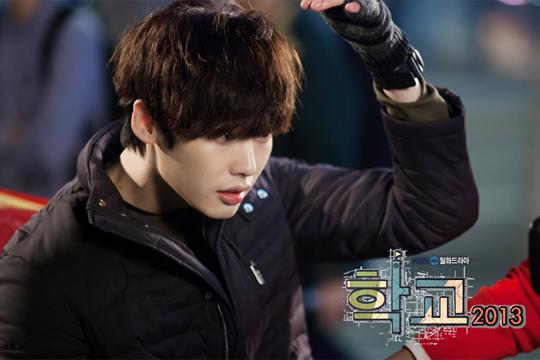
- <학교>, 그 흔한 멜로라인 없어도 흥미로운 이유
[엔터미디어=신주진의 멜로홀릭] 자라나는 청춘들을 보는 것은 늘 조마조마하고 위태롭지만, 또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순간들은 항상 우리를 매혹시킨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드라마 혹은 학원드라마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유이다. 이런 학원물들이 이후에 스타로 성장할 신인연기자들의 등용문이 된다거나 대단한 스타 배우들 없이도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들일 뿐이다.
그만큼 불안과 기대가 충돌하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은 감개무량함, 그리고 먹먹함과 통증을 동반한다. 그것은 단지 아슴푸레한 첫사랑을 회고하는 식의 과거를 추억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보고 또 봐도 쉽게 물리지 않는 이런저런 성장드라마들의 원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2013>의 세계는 우리가 한때 지나쳐온 과거의 그곳이 아니다. 그 살벌하고 치열한 현장은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다. 나아가 그 현장은 우리 사회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이 되었다. 물론 드라마에서 노동현장이 다루어지지 않는 한에서 그러하다.
1999년의 <학교>로부터 14년이 지난 <학교2013>의 현실은 훨씬 어두컴컴해지고 막막해졌다. 아이들은 더 이상 풋풋하거나 상큼하지 않고, 낭만과 치기 따위가 남아 있지도 않다. 그들은 형편없이 짓눌려 있거나 몹시 영악해졌거나 더욱 험악해졌다. 이는 단지 폭력이 늘었다거나 하는 현상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젊음의 특권인 연애사건도 발생하지 않고 그 흔한 멜로라인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다수 학원물들과는 달리 젊고 수려한 배우들을 떼로 등장시키지 않은 것도 꽤 적절한 선택이었다.
<학교2013>이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절대적 혼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학원물에는 모범생이 있고, 문제아가 있었다. 좋은 교사가 있었고, 나쁜 교사가 있었다. 양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문제아들을 결국 계도할 수 있는, 나쁜 교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학교가 지향해야할 뚜렷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2013>의 세계에는 학교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근본적 회의가 있으며, 학교는 아이들을 계도해야할 힘을 잃었다. S대에 목을 매는 모범생 송하경(박세영)이나 김민기(최창엽)는 문제아들을 끌고 갈 어떤 정당한 힘도 갖지 못하고, 문제아인 고남순(이종석), 박흥수(김우빈) 들은 모범생이 되어야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얻지 못한다. 모범생들은 결코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문제아들은 한번 찍힌 낙인을 지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 이제 모범생과 문제아는 그저 대학 갈 수 있는 아이들과 대학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대입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굴러가는 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로지 대입에만 관심을 쏟는 유능한 스타 강사 출신 강세찬(최다니엘)이나 인정사정없이 야멸찬 교장 임정수(박해미)도 그렇게 자신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학교가 내치는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려는 기간제 교사 정인재(장나라)나 나이든 평교사 조봉수(윤주상)의 노력이 입시중심의 학교체제를 바꿀 것 같지도 않다.
그야말로 정인재도 강세찬도 정답을 내놓지 못한다. 이들이 교양수업이냐 대입형 수업이냐를 놓고 대립할 때, 전체 교육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느 쪽도 정답이 될 수 없는 현 교육현실의 모순이 생생히 드러난다. “기초학력이 없는 하위권 애들은 아예 수업 포기할 거구요.”(인재) “지금도 반 이상이 포기인데요, 뭐.”(세찬) “그래도 쉽고 흥미로운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요. 사실 아이들한테는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인생 통틀어서 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고2, 2학기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기회구요.”(인재) “그렇죠, 정말 마지막 기회인거죠, 애들한테. 대학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세찬)
따라서 배제되고 버려지고 폭력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구하려는 정인재의 눈물겨운 안간힘은 강세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도 충분히 뜨겁게 해주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온정주의는 여전히 무력하다. “아직은 아이들의 손을 놓을 때가 아니다”, “이 정도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요?”, 그녀가 고남순을, 박흥수를, 그리고 오정호(곽정욱)를 포기하지 않고 보듬을 때, 교육체제의 문제가 몇몇 폭력적인 아이들을 끌어안는 문제로 치환되는 현실을 어찌할 것인가.
그것은 학교에 아무런 기대도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는 현실의 문제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폭력이 아닌 시스템의 폭력이다. <학교2013>은 학교 시스템의 폭력적 현실을 잘 보여주지만, 여전히 그 해결책은 정인재와 같은 몇몇 인간적이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버려진 양들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참담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칼럼니스트 신주진 joojin913@entermedia.co.kr
[사진=KBS]
저작권자 ⓒ '대중문화컨텐츠 전문가그룹' 엔터미디어(www.enter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