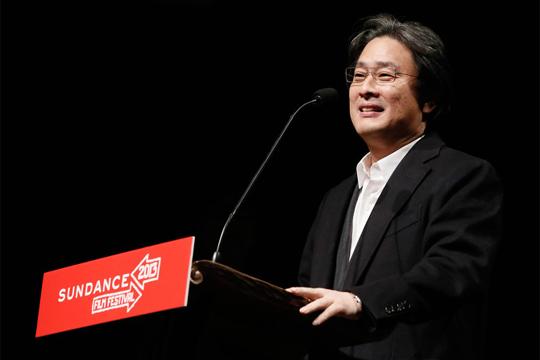
- 박찬욱·김지운 할리우드 진출의 진짜 의미
[엔터미디어=듀나의 영화낙서판] “최초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한국 감독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여럿이다. 이미 1988년에 이두용이 미국에서 <침묵의 암살자>를 찍었고, 신상옥은 이후 <닌자 키드> 시리즈를 찍었다. 이지호 감독의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한국 이름을 가진 감독이 만든 인디 미국 영화들도 꽤 있는 편이다. <나무없는 산>의 감독 김소영이 얼마 전에 내놓은 폴 다노 주연의 <포 엘렌>이 그런 영화다. 굳이 한국 이름을 미국 영화에 박는 것이 목표라면 우린 이미 이루었다.
하지만 김지운과 박찬욱의 할리우드 진출은 여전히 굉장한 의미가 있다. <라스트 스탠드>와 <스토커>는 대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할리우드’ 영화이다. 괜히 우리 쪽에서만 호들갑을 떠는 작품도 아니고, 출연 배우도 만만치가 않다. 니콜 키드먼과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를 김지운과 박찬욱이 찍고 온 것이다.
이 두 영화가 모두 미국적인 장르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김지운은 의도적으로 서부극 스타일의 액션물을 택했다. 박찬욱은 미국적인 특성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아메리칸 고딕의 익숙한 세계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화에는 외국 이름들이 부글거린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에두아르도 노리에가, 니콜 키드먼, 미아 바시코프스카, 매튜 굿, 재키 위버는 모두 외국인들이다. 영어를 거의 못하는 한국 감독들이 오로지 영화 속의 미국만을 보고 상상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 피와 살을 제공해주는 배우들 상당수(<스토커>에서는 전부)가 외국인인 것이다.
그 때문인지 그들이 만든 세계는 뻔뻔스럽게 미국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미국 영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거나 변형된다. 액션보다는 드라마가 위주가 되는 <스토커>에서 그런 면이 더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주인공 소녀 인디아가 다니는 학교는 이상할 정도로 생기가 결여되어 있다. 진짜 학교 같지도 않고,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학교 같지도 않다. 아마 그것들을 몇 번 더 카본 카피해 흐릿하게 만들면 <스토커>의 학교가 나올지도 모른다.
두 영화 모두 대사에서 문제가 있다. <라스트 스탠드>에선 대사 통제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채 찍은 게 분명한 부분이 툭툭 튀어나오고, 훨씬 꼼꼼하게 대사 작업을 한 <스토커>의 경우에도 선댄스에서 이 영화를 본 많은 미국 관객들이 ‘외국 영화의 번역’ 같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다. 이는 보기에 따라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미국 작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언어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굳이 감독 자신이 영어를 배우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로서 두 작품의 장점이 있다면, 두 감독의 개성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국가의 스타일에 특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우삼이 할리우드에 들어와 찍었던 영화들 같은 것들 말이다. 언어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를 지금의 완성도로 만들 수 있었다면, 할리우드에서 감독의 효용가치가 훨씬 높아진다.
그보다 더 눈에 뜨이는 것은, 두 감독이 할리우드의 자산을 제대로 이용해먹고 즐긴 티가 난다는 것이다. 주연배우 이름들을 다시 읊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해리 딘 스탠튼, 에두아르도 노리에가, 주디트 고드레슈, 하모니 코린과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무슨 기분으로 이 영화에 출연했던 걸까. 시치미 뚝 떼고 필립 글래스에게 영화에 나오는 피아노 음악을 작곡하게 하거나 메리 앨런 마크에게 스틸 사진을 맡기는 재미는 어떨까? 국위선양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낯선 땅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의 진짜 재미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나가 첫 영화를 만들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이런 재미를 신나게 누렸다면 그것만으로도 멋진 일이 아니겠는가.
아직 올해의 첫 도전을 정리하기엔 아직 이르다. <라스트 스탠드>는 흥행성적이 처참했지만 평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총기 이슈와 주연배우의 스캔들이 아니었다면 반응이 더 좋았을 것이다. <스토커>는 아직 미국 개봉을 준비 중인데, 미국 5대 도시에서 조금씩 개봉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첫 주 흥행 1위나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도 이 영화는 초반 평이 아주 좋은 편이다.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썩토지수나 IMDb의 평점 점수는 내려가겠지만, 이 정도면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도 좋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흥행 성적이나 썩토지수가 아닐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도전을 통해 한국 감독들에게 할리우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감독들의 보다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제작하는 다국적 캐스팅 영어영화인 <설국열차>의 결과물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듀나 djuna01@empas.com
저작권자 ⓒ '대중문화컨텐츠 전문가그룹' 엔터미디어(www.enter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